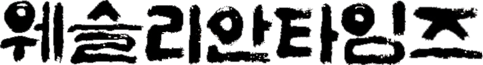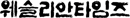바야흐로 장마철, 각양각색 벌레들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 곤충도 좋아하지 않는데, 해충은 말할 것도 없다. 나타나면 오도방정 난리를 치게 된다. 어려서는 더 했지만 이제 좀 나아졌다고 해도 오십보 백보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벌레 없이는 불가능하다.
얼마간의 도시 생활이 좋았던 이유들을 나에게 손꼽으라고 하면 시골보다 벌레가 없다는 것이 열 손가락 안에 든다. 벌레 유무가 내 생활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만큼 비중이 크다. 어찌보면 이것은 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시 돌아와 시골, 그것도 야트막하지만 낮은 산자락에 교회 자리를 잡으며 ‘아 내가 다시 시골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든 첫 번째가 칠흑같이 깜깜한 밤, 두 번째가 바로 온갖 ‘벌레들’의 등장이었다. 창문에 다닥다닥 붙은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데굴데굴 콩벌레(쥐며느리), 미끌미끌 민달팽이, 좁쌀만한 나방부터 참새만한 나방까지...
기껏 사람을 물지도 않을 거면서 소금쟁이처럼 껑충거리다가 날다가 향방없이 다니는 다리가 긴 왕모기, 살짝만 건드려도 으스스 다리들을 제몸에서 털어내는 일명 ‘돈벌레’, 슬슬 기어다니는 2센티미터 정도 길이의 진갈색의 노래기, 온갖 크기의 날고 기는 딱정 벌레들. 이것들이 눈에 띌 때 잡아 줄 누군가가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다. 일단 그릇으로 덮어두고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작은 축사가 교회 가까이에 있었다. 개척한 첫 해, 그곳에 가축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선지 파리가 어마어마했다. 일회용 장갑에 물을 채워 처마에 걸어 두기, 천정에 붙여 길게 늘어지게 하는 파리 끈끈이, 바닥엔 A4 크기의 끈끈이 종이를 여기저기 펴 놓았다.
바닥에 깔아 둔 끈끈이에는 파리가 붙기 전에 우리 어린 성도들이 먼저 가서 붙어 있곤 했었다. 발바닥에 파리 끈끈이 종이를 질질 끌고 다니는데 ‘아, 별일이 다 있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에프킬라 한 통은 파리모기 잡는 대신에, 맨발에 붙은 파리 끈끈이 떼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시골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네’를 본적이 없었다. 오일장에서 딱딱하게 말려 있는 진갈색의 모조품 같은 약재의 형태로만 보았을 뿐이었다. 드디어 올해 지네를 보았다.
새끼 발가락이 따꼼해서 보았더니 세상에 그 말로만 듣던 지네가 에스라인을 그리며 이불 위로 슥슥슥 지나갔다. 일단 물로 새끼 발가락을 충분히 씻고 눈을 감고 한 손은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 손은 언제든 쓸 일이 있겠다 싶어 상비해 놓은 파리채로 탁탁탁.
새벽 두시의 해프닝.
빈틈많은 시골의 집, 하나님의 온갖 피조물과의 동거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곧 시작하는 장마의 기간, 부디 벌레들과의 조우가 없기를, 오고가는 길에서 길든 짧든 뱀을 만나지 않기를, 특별히 지네는 그만 나타나기를...
장마철을 앞둔 시골 교회의 어떤 목사는 이런 기도도 한다.
벌레를 견디는 나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이보다 더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큰 상급이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