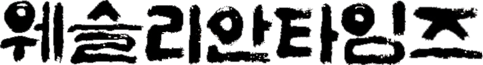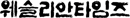교회 잔디밭이 잔디밭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풀밭이 되어 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좀 과장하자면, 잔디밭에서 토끼풀밭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내버려 둔 잔디밭에 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랐다. 예초기를 둘러매고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초기 소리에 놀랐는지 풀썩풀썩 튀어나오는 놈들이 보이는데 개구리다. 우리나라 곳곳에 흔히 있기는 하다지만 참개구리가 천안 도시에 살고 있다니 풀이 어지간히 무성했나 보다.
개구리는 풀이 깎여 나가는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계속 숨어들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그쪽 풀도 베어버리니 그동안 맘 편히 살던 개구리로서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도 다른 방도가 없어서 결국 풀을 짧게 다 베어서 어느 정도 잔디밭의 모양을 갖춰 놓았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은 키 큰 풀로 가려져서 축축했던 바닥을 금방 다 말려 놓았다. 그제야 습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개구리가 어디로 갔나 궁금하고 미안했다. 그리고 아차 싶었다. 조금만 더 개구리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풀을 다 베어 버리지 않고 개구리가 머물 수 있는 ‘풀 섬’을 남겨 놓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개구리가 담벼락 밑, 조금씩 흐르는 물가로 갈 수 있도록 ‘풀 길’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잔디밭의 풀은 또 자랄 것이고 나는 게으름을 피우다 풀이 무릎까지 자라고 나서야 또 예초기를 들 것이다. 그때 개구리가 아직 잔디밭에 살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개구리들이 살아가는 풀 섬과 풀 길을 만들 생각인데 이것이 개구리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내미는 나의 손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몹시 불던 밤이 지났다. 교회 꽃밭의 키 큰 접시꽃들은 원래의 자기 자세를 잃고 뭉실뭉실 달린 꽃이 땅에 닿을 듯 넘어져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키가 훌쩍 큰 옥수수들도 꼿꼿이 하늘을 향하던 자세를 잃고 땅을 향해 누웠다. 또 비가 오기 며칠 전에는 작고 하얀 나비가 마치 땅을 날개로 쓰는 듯 바닥에 붙어 오랫동안 날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입구의 접시꽃과 텃밭 구석의 옥수수,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작은 나비는 하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땅을 잊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다. 하나님나라를 향한 여행길에 선 자의 손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인생학교’를 세운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Roman Krznaric)의 짧은 글은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손을 내미는 일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하게 한다.
“내가 아는 배관공 한 사람은 길가에 핀 꽃을 볼 때마다 차를 세우고 잠시 내려 꽃향기를 맡는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 섰다 가야 해. 내일은 저 꽃이 없을지 모르거든’”
길가에 작은 꽃 하나를 보기 위해 차를 세우는 마음, 내일은 저 꽃이 없을지 모르니 오늘의 걸음을 멈추는 마음, 이 마음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께서도 손을 내미시는 분 아니었던가!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분이 예수이시고 열두 해를 앓던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를 향해 손을 내민 여자에게 기꺼이 자신의 옷깃을 내밀어 주신 분이 예수이시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향해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며 그의 굽은 손을, 그를 외면했던 이들이 잡을 수 있는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이시다. 주님은 또 오른손을 내미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시편 60:5)이시니 과연 예수께서는 우리 손을 마르고 닳도록 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손을 내밀어 이웃의 손을 잡는 것은 평화를 희망하는 몸짓이자 결단이다. 하늘은 우리에게 꽃을 선물로 주지만 내가 손을 내밀어 받지 않으면 하늘도 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예수께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시며 건네시는 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복음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자 여기에서 하나님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하루 교회를 오가며 장마 시작부터 몰아친 비바람에 땅을 향해 넘어진 접시꽃과 옥수수를 몇 번이나 보았다. 젊은 시절 농사꾼이셨던 집사님에게 넘어진 옥수수 일으켜 주면 별 탈 없이 잘 살겠지요? 물어보기까지 했다. 집사님은 어서 일으켜 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수수를 바라보았다. 교회 들어오는 길의 접시꽃도 넘어져 있지만 아직 생생한 것을 보아 다시 자세를 잡아 주면 아무런 일 없이 잘 클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빨리 자기 손을 잡아 달라고 줄기를 뻗치는 접시꽃과 옥수수를 보고 이런저런 궁리만 할 뿐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다. 접시꽃과 옥수수는 아무도 자기의 손을 잡아 주지 않는 어둔 밤을 지내야 할 것이고 나는 내일 아침에야 교회에 가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작정이지만 그나마 비가 오면 내밀었던 손을 급히 주머니에 집어 넣을 것이 확실하다.
어휴, 몇 년 전 드라마에서 왜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그랬는지 알겠다. 그때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